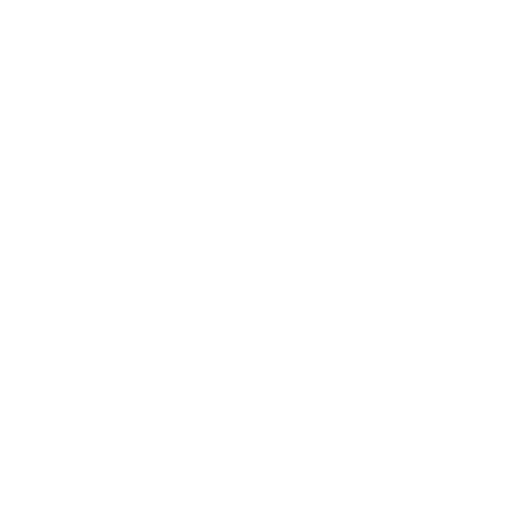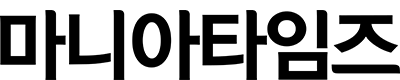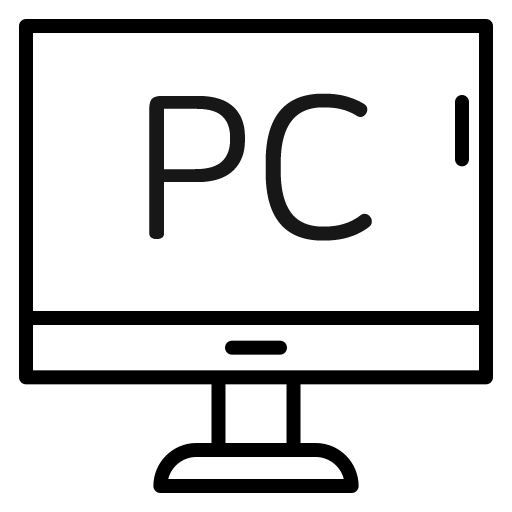![[프로야구 손자병법]32-⓹ 3金의 전술전략-김응용의 역설 용병법](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704073334024118f6b75216b21121740159.jpg&nmt=19)
프로야구 감독의 용병술과 전술은 획일적이지 않다.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그 때 그 때 달라진다. 나름의 원칙이야 있지만 고체는 아니다. 아군이 강하면 밀어붙이지만 약하면 우회 전략을 써야 한다.
김응용 감독은 보기보다 유연하다. 김인식 감독은 당연히 유연하다. 김성근 감독은 원칙을 우선한다. 김응용, 김인식은 숲을 보고 김성근은 나무를 먼저 본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꼭 그런 건 아니다.
김응용 감독의 용병술은 ‘역설 용병법’이다. 기를 죽여서 기를 세우고 침묵으로 칭찬을 대신하다. 강할 땐 엄살을 피우고 약하면 큰 소리 친다.
김봉연, 김성한이 득세하고 있던 타이거즈 초년 시절. 천하의 김동엽 감독마저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였다. 꺾지 않으면 꺾인다고 판단한 김응용은 중심타선을 뒤흔들었다. 첫 고비를 넘지 못하면 길게 갈 수 없었다.
신인 양승호를 4번에 배치했다. 한 달 정도 말아먹어도 그만이고 한 시즌 날리면 그만이라는 생각까지 했다. 설마 하며 상황을 지켜보던 ‘김포’들은 ‘비정상 포진’이 계속되자 항복했다. 달라진 그들을 보며 김 감독은 비상계엄령을 해제 했다. 근 한 달 여 만이었다.
선수단을 완전히 장악한 김 감독은 해태를 의도한 대로 끌고갔다.
2001년 삼성에서의 첫 일성이 ‘선수가 없다’였다.
인터뷰 때마다 그 말을 달고 살았다. 최고타자 이승엽을 비롯해 그야말로 막강 전력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술 더 떠 이승엽은 쓸 만하지만 홈런에 영양가가 없다고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임창용은 결정적일 때 한 방씩 얻어터진다고 했다. 무엇보다 아픈 선수들이 너무 많다며 부상자들을 모두 제외하면 남는 선수가 없다고 했다.
한 마디 더 덧붙였다.
“주전은 없다. 이름으로 야구 하는 건 아니다”
신임 감독의 ‘엉터리 같은 엄포’는 효과가 있었다.
부상선수가 사라졌다. 병원 간다고 늦게 나오는 선수도 없었다. 알아서 움직이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됐다.
스타급 선수들을 지나치게 함부러 대하는 감독을 보며 적잖이 걱정했던 구단 프런트는 김응용의 오묘한 카리스마에 압도, 일사분란하게 그를 지원 했다.
무명의 신인들에겐 반대의 전략을 쓴다.
고졸 신인 김상진은 좋은 선수였다. 장래가 확실했다. 그러나 담력이 약했다. 김 감독은 김상진을 마운드에 올려놓고 못 본 척 했다. 안타를 맞고 볼넷을 내주고 점수를 마구 주어도 딴 청만 했다.
내릴 때가 지났음에도 내리지 않는 김응용. 감독을 연신 쳐다보던 김상진은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 감독이 망신을 주려고 일부러 이런다고 생각했다. 체념과 함께 화가 일었다. 입에서 욕지거리가 터져 나올 판이었다.
‘그래, 실컷 얻어터지자. 마구 점수를 내주는 것으로 복수하자’
‘될 대로 되라’고 던지자 공이 좋아졌다. 원하는 곳으로 공이 들어가고 속도도 빨라졌다. 타자들이 맥없이 물러났다.
덕 아웃의 김응용은 지켜보고 있었다. 재목은 좋은데 여린 김상진에겐 투구 술보다는 마음의 담금질이 우선이었다. 자신감 상실-애원-체념-분노는 새 가슴이 강심장으로 가는 심리적 코스. 말로 타이르는 것 보다 실전에서 무너지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했다. 최소 몇 게임 버려야 하지만 하나를 버려 열 개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이다.
좋은 선수보다는 필요한 선수.
삼성은 좋은 선수가 차고 넘쳤다. 이름만 보면 국가대표 급이었다. 한국시리즈 우승을 위해 괜찮다싶으면 앞뒤 재지 않고 쓸어 담았다. 다른 팀으로 가면 주전인데 삼성에선 벤치에 앉아있는 경우도 허다했다.
김 감독의 ‘선수가 없다’는 말에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었다.
1루수는 호화판이었다. 이승엽, 양준혁에 마해영까지.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 한 에이스 2명은 늘 놀아야 한다. 2루수, 외야수도 넘치긴 마찬가지였다. 많으면서 모자라는 ‘풍요속에 빈곤’이고 모자라는 것 보다 못한 과유불급(過猶不及)이었다.
넘치는 선수를 빼고 필요한 곳에 박을 1명의 선수가 필요했다. SK의 외국인 유격수 브리또가 표적이었다. 브리또는 타율 3할2푼9리에 홈런 37개의 세련된 수비수였지만 코칭 스탭과 호흡이 맞지 않았다. 생각대로 안 되면 출전을 거부하기도 한 ‘아픈 어금니’였다.
2-6의 트레이드. 숫자도 숫자지만 삼성에서 건너가는 선수들의 면모가 화려했다. 김기태, 김태한, 김상진, 김용훈, 김동수, 정경배 등 모두 한때는 한 가닥 했던 에이스 급이었다. 수십억의 돈까지 쏟아 부은 선수들이었다.
분명 손해 보는 장사였지만 김 감독은 흡족해 했다. 좋은 선수들이긴 하지만 삼성에선 없어도 그만인 과유불급 형 이었다. 결국 구조조정까지 겸한 이 트레이드의 결과로 삼성은 그 해 한 맺힌 한국시리즈 첫 우승을 차지했다.
홈런에 영양가가 없다고 했던 이승엽이 지는 줄 알았던 LG와의 2002년 한국시리즈 6차전 9회 말 동점 3점 홈런을 터뜨려 김 감독을 살렸다. 김 감독은 20타수 2안타로 극히 부진했던 이승엽을 그래도 믿고 내보냈고.
[이신재 마니아리포트 기자/news@maniareport.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report@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