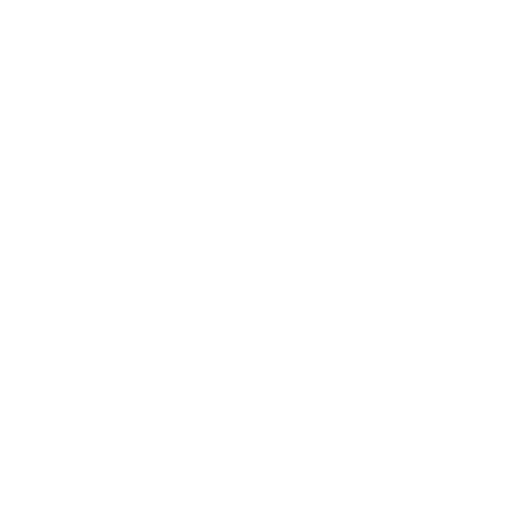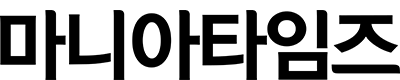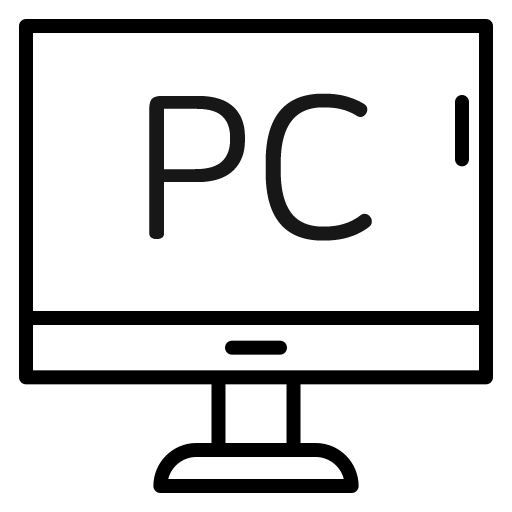![[프로야구 손자병법]32-⓽ 3金의 인생유전(人生流轉)과 한화(完)](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708002328056668f6b75216b21121740159.jpg&nmt=19)
세월은 공평하다.
한 시절을 호령했던 프로야구계의 거장 김응용, 김성근, 김인식에게도 세월은 어김없다. 어느 새 뒷 물결에 밀려나는 장강의 앞 물결이 되었지만 서운 할 건 없다. 순리니까.
김응용의 야구 인생은 참 길었다.
20줄에 이미 감독. 코치를 거치지 않아 감독 나이만 50이다.
한국시리즈 10회 우승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해태 한 팀에서 18년 있으면서 세운 9회 우승의 기록 역시 깨기 힘들다. 프로야구가 날로 진화하고 세대교체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야구는 언제나 사람을 설레이게 한다’는 김응용. 감독을 거쳐 구단 사장을 하고 야구협회장을 하면서 어린이 야구를 육성하는 등 참 다양한 야구 길을 걷는다.
김성근은 다양하게 야구계를 누볐다.
김성근은 최장 기간 프로야구계에 머문 감독이다.
프로 원년인 1982년 코치로 데뷔했고 2년 후 OB베어스 감독직을 시작하면서 숱한 팀을 다녔다. 그가 감독으로 거친 팀은 태평양 돌핀스, 삼성 라이온즈, 쌍방울 레이더스, LG트윈스, SK 와이번스, 한화 이글스 등 6개팀.
중간 중간 지휘봉을 놓았지만 야구 판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다. 해태 투수 인스트럭터, 해태 2군 감독, 삼성 2군 감독, LG 2군 감독, 지바 롯데 마린스 팀 타격 코디네이터와 순회 코치, 고양 원더스 감독 등 잠시도 쉬지 않았다.
생소한 직함이 더러 있지만 어떤 역할이든 부르는 곳이 있으면 자리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만큼 쓰임새가 많다는 증거이겠다.
일찍 시작했지만 만개는 상당히 늦었다. 명감독 반열에 항상 올랐지만 한국시리즈 우승과 인연을 맺은 건 65세의 아주 늦은 나이이다.
직장인들의 은퇴시기를 훌쩍 넘은 65세에서 70세 사이가 그의 전성기였다. 늦었다고해서 대기만성이라는 단어로 그의 경력을 논하는 건 실례일 듯하다.
‘언제나 야구 생각 뿐’이라는 집념이 무섭다.
김인식은 두산에서만 한국시리즈 2회 우승을 했다. 감독 입문으로 보면 5년 만이다. 김인식은 그러나 말년에 프로 야구 쪽에서 보다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더 이름을 날렸다.
대표팀의 전력 약화로 감독 희망자가 없었을 때도 그는 기꺼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국가가 없으면 야구도 없다’는 그의 ‘위대한 여정’은 성공적이었다.
팀이 약할 때도 김인식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뻔히 알면서 약한 팀의 사령탑에 앉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 김인식에게 그 도전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였고 즐거운 의무였다.
김인식은 힘들어도 피하지 않았다. 그에게 승패는 다음 문제였다. 가야 할 길이기에 갈 뿐이었다.
김인식은 ‘야구는 언제나 어렵다’면서도 야구를 즐겼다.
3김의 프로야구 종착역은 한화였다.
쓸쓸한 내리막 길 이었다.
종착역은 싫든 좋든 늘 아쉬움이 남는다.
김응용과 김성근에게 한화는 보너스였다.
영광된 무대의 막이 내려가 끝난 줄 알았는데 커튼 콜에 의해 다시 나온 노배우. 하지만 그 보너스는 독약이었다.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으나 생각보다 훨씬 쓴 약이었다. 그렇다고 그들의 기록이 묻히지는 않는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것일 뿐이다.
그들은 앉을 나무를 잘 못 골랐다.
강병철감독의 말이다.
“동네마다 특유의 기질이 있죠. 충청도 쪽은 늘 반응이 미적지근한 편입니다. 다른 동네는 처음 만나 수틀리면 일단 대듭니다. 약하게 나가면 그걸로 시합은 끝난 겁니다. 강하게 대응하면 이내 수그러들지만 앙앙불락이죠. 두세 번 더 손을 보면 그때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아닙니다. 대들지도 않지만 속을 주지도 않아요. 순한듯하지만 그렇다고 따라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그들이 마음을 여는 것은 아주 한참 후고 그동안 속 터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화는 양김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
김인식과는 그래도 가장 잘 맞았다. 김인식은 사실 실패하지 않았다.
한화를 우승 시키지는 못했지만 한국시리즈로 이끌었고 포스트 시즌에서 나섰다.
한화 선수들이 떠나는 날 김인식에게 큰 절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존경의 표시고 다른 하나는 존경하는데 잘 못해서 미안하다는 뜻이다. 미안하지만 능력이 그러니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김응용은 서둘렀다.
오랫동안 현장을 떠나있어서 야구에 대한 감도 떨어졌고 젊은 선수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다. 원래 소통파는 아니지만 너무 큰 벽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고’이다.
2년여의 시간에 우승을 하자면 삼성처럼 인재가 많은 팀이라야 한다. 그래야 작전도 짤 수 있는 것 아닌가. 인재는 모자라고 시간은 없고 뭔가는 보여줘야 하고 사면초가였다.
김성근은 조급증이었다.
김응용, 김인식을 뛰어넘는 한 방의 찬스로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빨리 해보려는 조급증이 있었다. 자신의 틀에 넣으려고 갖은 애를 다 썼지만 단시간에 그들을 좁은 틀 안에 넣을 수 없었다.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이다 보니 앞뒤 가릴 겨를이 없었다. 무리수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무리는 또 다른 무리를 낳았다.
나름대로 전력을 보강한 것 역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몰아치다가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
한화는 그들에게 무덤이었던가.
순리고 과정이다.
세월.
세월이 무덤이었다.
[이신재 마니아리포트 기자/news@maniareport.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report@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