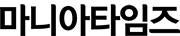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마니아 스토리] 스포츠 스타들의 골프 이야기 8- ‘거지 파’의 달인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530090813015678f6b75216b21121740159.jpg&nmt=19)
드라이브는 쇼, 아이언은 예술(과학), 퍼팅은 돈이고 어프로치는 스코어라는 말도 그래서 생겨났을 터. 다른 운동과는 달리 운동신경이 좀 떨어져도 열심히 연습하면 중간은 갈수 있고 덕분에 누구라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탁구나 양궁 등은 골프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한 경험이 있어 적응은 좀 빠른 편이나 도구의 활용법이 달라 오히려 애를 먹는 경우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드라이브 거리가 200야드가 좀 안 된다. 신체조건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닌 터에 보통의 주말 골퍼보다 거리가 오히려 적게 나가니 ‘국가대표 출신과 내기 한 번 해볼까’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세컨 샷은 아이언보다 힘을 덜 써도 되는 우드가 편하다며 5번 정도의 우드를 쓴다. 드라이브 거리가 짧은 편이라서 그런가보다 하지만 그걸로 올리지도 못한다. 쓰리 온. 투 퍼팅이면 보기. 그러나 결과는 파. ‘오늘 운이 좋은 편인 모양이다’고 한 두번 넘어가지만 그의 파 행진은 멈출 줄 모른다.
한 두 번이 아니라 너 댓 번이면 운이 아니라 실력. 강감독보다 티샷을 30~40야드 이상 보내고도 그를 이기지 못한 80대 중후반의 주말골퍼는 혼자서 씩씩대다가 이내 무너진다. 그리고 평소 실력보다 못한 90을 그리고 만다.
강 감독은 변함없이 80대 초반. 흔히 ‘3학년 1반’이라고 하는 ‘쓰리 온 원 퍼팅’전문이다. 문전에서 구걸하듯 겨우 겨우 빌어서 파를 한다고 해서 ‘거지 파’로 실전에서 만나면 매우 무섭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잘하는 것이 어프로치.
강 감독은 티샷에 서면 단숨에 자신만의 코스 공략 법을 기획한다. 드라이브로 180을 보내고 두 번째 샷을 그린 근처에 보낸 후 세 번 째 칩샷을 바짝 붙여서 한 번에 집어넣는다. 거리가 짧은 대신 드라이브와 세컨 샷을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뜨린다.
세컨 샷을 그린 근처 30야드 안팎에 갖다 놓는 경우는 열 번에 여덟 번 정도. 거기서 홀에 붙에 원 퍼팅 하는 확률 역시 열 번에 여덟 번. 그래서 그는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다.
골퍼는 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드라이브 거리가 짧다고, 폼이 그다지 세련되지 않았다고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 강호는 넓고 특이한 검법의 강자는 의외로 많다.
[이신재 마니아리포트 기자/news@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