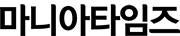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지난 해 윔블던 남자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노바크 조코비치. [UPI=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217083633029135e8e9410871751248331.jpg&nmt=19)
테니스는 원래 프랑스 귀족들이 즐기던 ‘죄드폼(Jeu de Paume)’이라는 공놀이에서 유래됐다. 이 공놀이가 영국으로 전해지면서 테니스가 만들어졌다. (본 코너 901회 ‘왜 ‘테니스’라 말할까‘ 참조) 테니스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즐겨 신사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테니스 경기 특성상 몸을 격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땀을 흘려 옷이 얼룩달록해지는 것은 고고한 예절을 추구하는 귀족들의 품위에 잘 맞지 않았다. 땀 얼룩이 잘 드러나지 않는 색깔인 흰색을 옷색깔로 정하게 된 이유이다.
흰색 옷을 처음 규정으로 제정한 것은 1877년 창설돼 가장 오래된 테니스 대회인 윔블던이었다.(본 코너 906회 ‘왜 ‘윔블던’이라고 말할까‘ 참조) 윔블던의 흰색 옷 전통은 시대가 흐를수록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강화돼 나갔다. 선수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색깔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지만, 대회 조직위원회는 규정을 강화해 이를 차단하려 한다.
윔블던 복장 규정 9항에 '10㎜를 넘지 않는 넓이의 테두리에는 색깔이 들어가 있어도 된다'는 예외 규정으로 인해 부샤드는 계속 경기할 수 있었다.부샤드의 스포츠브라 어깨끈의 넓이가 10㎜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윔블던 복장 규정 7항에는 '모자, 헤드밴드, 두건, 손목밴드, 양말은 모두 흰색이어야 하고, 10㎜가 넘게 색깔이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윔블던 대회장에 들어오는 의료진도 흰색 옷을 입어야 한다. 10항에는 "가능하면 의료진도 흰색 옷을 입어야 한다"며 "다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색깔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윔블던은 엄격하게 ‘올 화이트’ 드레스코드를 적용하고 있지만 올림픽 때는 선수들에게 흰색 옷 규정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수들은 대개 흰색을 입고 출전한다. 그만큼 ‘올 화이트’ 전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