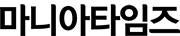듣기에는 참 안타깝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야구 감독이 '협박' 때문에 물러났다는 이야기는 낯설다 못해 씁쓸하다.
물론 그 협박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건 안다. 세상이 달라졌다. SNS와 도박 산업의 팽창으로, '익명의 증오'는 지도자에게도 쏟아진다. 쉴트는 수면 부족과 가슴 통증, 탈모까지 호소하며 결국 "이제는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만한 고백이다. 그러나 감독이라는 자리는 그런 감정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다.
쉴트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패한 뒤 사퇴를 결심했다. 공교롭게도 그가 마지막으로 비판받은 장면은 '멘탈'이었다. 2승 1패로 앞서던 디비전시리즈 4차전, 쉴트는 조급증을 이기지 못했다. 1차전에 나섰던 딜런 시즈를 또다시 4차전 선발로 투입했다가 완패. 그리고 다음날, 시리즈도 무너졌다.
그 패배의 원인은 기술보다 심리에 있었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보다 '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이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자마자 쉴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집에 가고 싶다." 그 말 한마디는 감독으로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살해협박이라면, 행크 애런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974년, 그는 백인 베이브 루스의 714홈런을 넘어설 때 무려 93만 통의 협박 편지를 받았다. "죽이겠다", "너 같은 흑인이 루스를 넘을 자격이 있느냐."
그 편지들 속엔 증오와 인종차별이 가득했다.
애런은 두려움을 이겨냈고, 쉴트는 그 두려움에 지배당했다.
감독은 팀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다.
그 나침반이 흔들리면, 배는 길을 잃는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욕을 먹고 협박을 받아도, 감독이 버텨줘야 한다. 그게 리더다.
쉴트는 좋은 감독이었다. 카디널스 시절부터 합리적인 전술과 소통 능력으로 인정받았고, 파드리스를 90승 팀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바로 '멘탈'이 빠져 있었다.
야구는 단순히 기술의 스포츠가 아니다.
압박을 이겨내는 자와 무너지는 자의 싸움이다. 행크 애런은 증오의 편지 더미 속에서도 방망이를 휘둘렀고, 쉴트는 압박의 편지 몇 통에 손을 들었다. 그래서 씁쓸하다. 야구장 밖의 협박보다, 야구장 안의 공포를 먼저 이길 수 있는 자, 그가 진짜 감독이다.
[강해영 마니아타임즈 기자/hae2023@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