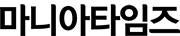래리 브라운(79)이다.
그는 1988년 캔자스대학을 NCAA 토너먼트 정상에 올려놓았고, NBA에서는 2004년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게 우승을 안겨주었다.
그에게 사령탑을 맡기기만 하면 바닥이었던 성적이 올랐다. 플레이오프 무대에 밟아보지도 못했던 팀도 그를 거치면 성공했다. NBA ‘최악의 팀’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던 LA 클리퍼스를 2년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으며, 약체로 평가받고 있던 덴버, 뉴저지, 필라델피아, 샬럿 등을 강호로 바꿔놓았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남감리대(SMU) 감독으로 활약하며 20여 년간 침체에 빠져있던 팀을 부임 2년만에 콘퍼런스 챔피언에 올려놓기도 했다.
감독의 최대 미덕은 ‘승리’다.
그래서 브라운에게는 덕장이니, 지장이니, 용장보다는 '승장'이라는 별명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가 SMU대학 감독직을 관둔 지 얼마 되지 않아 필자는 KBL(한국농구연맹)의 A 구단 관계자에게 “지금 브라운이 쉬고 있으니 한번 연락해보라”고 귀띔해주었다.
스포츠 중 감독의 영향력이 가장 큰 종목은 농구다. 5명의 소수가 하는 경기이기 때문이다. 감독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A 구단 관계자는 그러나 아쉽게도 필자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이후에도 A 구단은 여전히 승리를 안겨줄 감독을 찾지 못한 채 매 시즌 고전했다.
지난해 KCC 이지스에서 시즌 도중 감독직을 수행한 스테이시 오그먼이 시즌 후 이지스와 결별한 뒤 혹시 A 구단 감독이 되는 것은 아닌지 기대를 했으나 A 구단은 이번에도 다른 선택을 했다.
KBL 감독 중 외국 출신은 제이 험프리스와 오그먼 단 두 명에 불과하다.
최초의 외국인 감독이었던 험프리스는 2005년 전자랜드 감독에 취임한 첫 시즌에서 3승 17패로 고전했다.
험프리스 감독에게 잔뜩 기대를 했던 전자랜드는 실망했다. 결국, 한 시즌도 다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그를 해임했다.
험프리스의 실패는 다른 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코치는 몰라도 감독은 외국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압도했다.
사실 외국인 코치도 팀내 외국인 선수들과의 소통을 위해 영입한 측면이 강했다.
그로부터 14년 후 오그먼이 KCC 코치를 하다 추승균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물러나자 감독 대행이 됐다.
오그먼은 험프리스와 달리 팀을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는 등 성공적인 감독 데뷔 무대를 장식했다.
그러나 KCC는 오그먼 대신 전창진 씨를 감독으로 영입했다.
선진농구 기술 습득을 위해 미국 등 농구 강국에 갈 수 없다면, 그곳 전문가들을 데려오기라도 해야 한다.
KBL 팀들의 정신세계는 여전히 구한말 대한제국 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장성훈 특파원/report@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