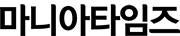북한에서 국제 대회에서 발군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스포츠영웅’으로 선정해 국민적 대우와 혜택을 제공한다. ‘공화국영웅’,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과 같은 공식 명예칭호가 주어진다. (본 코너 1553회 ‘북한에선 왜 ‘인민체육인’이라 말할까‘, 1554회 ’마라톤 정성옥이 스포츠 선수로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은 이유는‘, 1555회 ’ 북한에서 왜 ‘공훈체육인’이라 말할까‘ 참조)
남북한에서 ‘스포츠영웅(英雄)’이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영웅’이라는 개념이 스포츠 영역으로 확장된 사회적 언어의 산물이다. ‘영웅(英雄)’은 한자 ‘뛰어날 영(英)’과 ‘수컷 웅(雄)’이 합해진 단어이다. 본래 의미는 ‘뛰어나고 용맹한 사람’, ‘무공을 세운 장수’를 뜻한다. 중국 ‘사기(史記)’나 ‘한서(漢書)’ 등 고전에서 국가나 민족의 운명을 바꾼 인물을 가리켰다. 전쟁이나 정치적 격변의 시대에 집단의 운명을 대표하는 인물을 의미했다. 인터넷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면 국역 42회, 원문 114회등 총 156회나 검색돼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영웅이라는 말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영웅’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국민적 자긍심과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스포츠영웅은 체제의 상징이며, 국가 이념을 시각화하는 인물이 된다. 북한 스포츠영웅의 대표적 인물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8강 신화를 만든 박두익, 정성옥, 리호준, 박영순 등이다. 이들은 단지 승리한 선수가 아니라, ‘조국의 존엄을 빛낸 전사’로 추앙받았다. 금메달은 총검보다 강한 선전의 무기인 것이다.
북한의 스포츠영웅은 경기장 밖에서도 계속 무대 위에 선다. 그들은 체육단의 간부로, 청년들의 ‘충성 교육강사’로, 혹은 체육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개인의 삶은 사라지고, ‘혁명적 체육인상’이 덧씌워진다. 결국 북한에서 스포츠영웅이 된다는 것은 국가가 부여한 영광 속에 사는 것,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체제의 서사에 헌납하는 것을 뜻한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