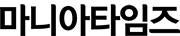한화는 두산전에서 선발 류현진을 끝내 믿을 수밖에 없었다. 6회까지 83구로 잘 막아낸 에이스를 7회에도 올린 건 무리일까.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다. 단 7구 만에 만루 홈런 포함 4실점으로 무너졌으니. 하지만 그 배경에는 '쓸 수 있는 불펜이 없었다'는 냉정한 현실이 있었다.
문동주의 부상, 폰세의 돌발 컨디션 난조는 로테이션을 꼬이게 만들었다. 대체 선발이 줄줄이 무너지고, 불펜은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이미 녹아 있었다. 롱릴리프 자원조차 마땅치 않았다. 김경문 감독이 류현진을 조금 더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선택이라기보다 강요에 가까웠다.
선발 이민석이 5회까지 완벽히 던졌지만, 6회 갑자기 무너졌다. 교체 카드로 올린 정철원은 이미 전날도 블론을 기록했던 불안한 투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마땅치 않았다. 정현수 역시 좌타자 매치업 원칙에 따라 기용했으나 연속 홈런을 맞으며 무너졌다. '한 박자 빠른 교체'를 해도, '조금 더 믿어보는 선택'을 해도 결과는 번번이 팀을 외면했다.
김경문과 김태형, 두 감독 모두 투수 교체 타이밍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불펜 과부하·엔트리 사정·대체 자원 부재라는 현실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물론 감독은 결과로 평가받는 자리다. 하지만 '한 박자 늦었다'는 말 속엔 언제나 결과론의 잣대가 숨어 있다.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과연 승리를 보장할 수 있었을까. 지금의 한화와 롯데는 '교체 타이밍'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묶여 있다.
[강해영 마니아타임즈 기자/hae2023@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