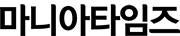페널티의 어원은 라틴어 ‘penalitas’, 고대 프랑스어 ‘penalitas’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법적 결정에 의해 규정된 처벌을 의미한다. 1885년 스포츠에서 처음 규칙위반으로 인해 경쟁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이라는 개념으로 도입됐다.
골키퍼 출신인 아일랜드 축구협회 회원이었던 윌리엄 매크럼(1865-1932)이 처음으로 페널티킥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한다. 당시 축구 경기에서 수비수가 공격선수에게 반칙하는 것을 막기위해 창안했던 것. 페널티킥 안은 잭 라이드 아일랜드 FA 총장이 1890년 6월 국제축구협회 이사회에 제출했다.
당시 안은 현재와는 많이 다르다. 의도적으로 상대 선수를 넘어 뜨리거나 붙잡거나 자신의 골라인에서 12야드 이내에서 공을 고의로 핸들링하는 경우, 심판은 상대편에게 페널티킥을 선언하도록 했다. 페널티킥을 찰 때 키커와 골키퍼를 제외한 다른 선수는 공 뒤 6야드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했다. 킥을 할 때 공을 인플레이상태여야 하며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당시 이 제안은 선수들과 언론으로부터 ‘아일랜드인의 결정’ 또는 ‘사형’ 등으로 불리며 많은 조롱을 받았지만 고의적으로 비 스포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점은 인정받았다. 신사스포츠로서의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는 '빅토리시 시대'의 이상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1891년 2월 영국축구협회 FA컵 8강전 스토크시티와 노츠 카운티 경기서 골라인에서 고의적인 핸들링은 간접 프리킥으로 인정해 페널티킥을 직접 골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페널티킥 규칙은 공식 제안된 지 1년 후인 1891년 6월 글래스고 알렉산드라 호텔에서 상당한 논의 끝에 영국축구협회 규칙으로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일제강점기때부터 ‘페널티킥’이라는 말을 썼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따르면 조선일보 1926년 11월20일자 ‘무오안악군(戊午安岳軍)과 숭덕군승리(崇德軍勝利)’ 기사는 ‘석간독보(夕刊讀報)=조선축구대회 제이일오후이시이분 배재구장(朝鮮蹴球大會第二日午後二時二分培材球塲)에서 청년단 고려대무오전(靑年團高麗對戊午戰)은 서병의씨(徐丙義氏)레퍼리 조동(趙東)□진번양씨 선심 고여선축(秦蕃兩氏線審高麗先蹴)으로개전(開戰)【후반(後半)】 안악일차(安岳一次)의 꼴킥이잇슨 후 오분(後五分) 동안 아콘너킥한 개(個)와 펜날터킥 연이차(連二次)를 당(當)하얏스나 선방(善防)하야 아직도죽첨(竹添)리드 하얏든바 구분(九分)부터 육박(肉迫)을당(當)하는 한편(便)으로 혼전(混戰)을이루어 꼴일점(一點)을 실(失)하매 일대일동점(一對一同點)이다가 십육분(十六分)부터 십분간(十分間)에 꼴사점(四點)으로 안악승(安岳勝)하얏다(오십분간(五十分間)’이라고 보도헀다. 당시는 페널티킥을 펜날터킥이라 표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래어 사용을 최소화하는 언어정책을 유지한 북한은 축구 규정의 기능이 곧바로 드러나는 기술적 조어로 페널티킥 명칭을 ‘11m벌차기’로 바꿨다. 이 말은 거리(11m)와 처벌(벌), 동작(차기)을 합쳐 의미를 설명하는 구조다. 페널티킥이 골라인에서 11m 떨어진 지점에서 반칙에 대한 처벌로 주어지는 킥이라는 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벌(罰)’이라는 단어다. 북한 스포츠 용어에는 규범과 징계, 사회주의적 질서를 강조하는 언어적 경향이 뚜렷하다. 단순히 기술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 위반에 대한 응분의 조치’라는 메시지를 언어 자체에 담아낸다. 흔히 말하는 ‘정치가 언어를 규정한다’는 말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본 코너 1581회 ‘북한은 문화어에서 스포츠 용어를 어떻게 바꾸었나’ 참조)
북한 체육보도서는 “전반 30분 상대방의 반칙으로 11m벌차기 기회를 맞았다”, “공격수는 침착하게 11m벌차기를 성공시켰다”, “11m벌차기 판정에 대한 항의가 있었으나 심판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등의 표현이 볼 수 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