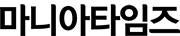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학시절의 경험 또한 충분히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전에서 한 경기라도 써먹을 수 있는 선수’를 원하는 팀은 오히려 대졸 선수를 선호한다. 또한, 1990년대 까지만 해도 고교야구에서 ‘특급’으로 분류됐던 선수들도 대학행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대학야구 무대 역시 패기와 노련함을 동시에 찾아볼 수 있는 ‘묘한 매력’이 담긴 공간이다. 이러한 대학 야구 대제전의 ‘절정’을 보여 주는 곳으로 ‘고려대-연세대 정기전(이하 고연전)’ 만한 무대도 없다.
미래의 스타 플레이어, ‘고연전’으로 본다.
정기 고연전이 아직까지 큰 파급효과를 갖는 것은 양 교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가 많이 배출된 이유도 있었지만, 한때 공중파로 전 경기가 생중계됐을 만큼 상당히 규모 있는 대회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이에 양 교 출신이 아닌 일반인들도 경기장을 직접 찾을 만큼 큰 관심을 보였으며, ‘오빠부대’를 몰고 다녔던 여고생들의 응원 열기 또한 상당했다. 많은 관중 속에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낸 이들은 향후 프로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난해에는 1학년 에이스 김주한의 역투를 앞세운 고려대가 3-1로 승리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경기에 나섰던 4학년 선수들 중 총 10명이 드래프트, 혹은 신고 선수 등의 형태로 프로에 입단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조금 달랐다. 에이스 이인복을 앞세운 연세대가 고려대에 3-1로 승리하며 지난해 패배를 설욕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와 똑같은 스코어로 승패가 갈렸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최근 2년간 양 교가 1승씩 나눠 갖는 동안 득점과 실점이 4점으로 똑같았던 셈이다.
이렇게 ‘사학의 제전’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만큼, 선수나 재학생 스스로 열정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정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지켜보는 눈이 많은 만큼, ‘지킬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법이다. 다만, 응원 열기나 양 교의 자존심 싸움이 너무 강렬하게 나타난 나머지, 지난해에는 친선을 도모해야 할 그라운드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며 한때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고연전 폐지를 주장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대학생 선수들은 아직 사회에 나오지 않은, ‘때 묻지 않은 성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숙함을 배우는 이들 중 故 최동원(연세대 졸업)과 같은 선수도 나오는 법이다.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