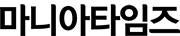박찬호 외에도 프로 선수 자격으로 참가한 선수들 중에는 심재학(당시 LG)처럼 아마 시절에 국제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이도 있었고, 박재홍(당시 현대)처럼 ‘리틀 쿠바’라는 별명에 걸맞은 모습을 보인 이도 있었다. 포수 마스크를 썼던 조인성과 홍성흔 역시 알루미늄 방망이로 언제든지 ‘한 방’을 노려볼 수 있었던 선수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1번 타자 역할을 누가 하느냐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했다. 동국대 박한이를 비롯하여 고려대 강봉규 등 대학 선수들의 기용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한국산 디마지오’, 이병규의 ‘PS 후(後)’
또한, 그는 ‘포스트시즌 경험이 거의 없는’ LG 선수단 중에서 유일하게 큰 경기 경험이 많은 이로 유명하다. 신인왕을 수상했던 1997년을 비롯하여 방콕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이듬해까지 2년 연속으로 한국시리즈를 경험했고, 양대 리그로 진행됐던 2000년에도 소속팀의 ‘매직리그’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LG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2002년 한국시리즈’에서 팀의 간판타자로 나서며 당시 부상 중이었던 김재현의 공백을 메우기도 했다. 일본에서 잠시 활약했던 2007년에도 주니치 드래건스의 일원으로 제펜시리즈 우승에 일조한 바 있다.
그랬던 이병규였기에, 일본으로부터 친정팀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우승’에 대한 욕심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의 귀국 이후에도 소속팀 LG가 ‘암흑기’에 빠져 좀처럼 가을잔치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그의 우승 욕심을 자극할 만했다. 결국, 그는 일본에서 복귀한지 4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포스트시즌을 경험할 수 있었다. 고비 때마다 유독 그가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었던 것도 오랜 기간 ‘유광점퍼’ 입기만을 기다려 왔던 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LG는 ‘아주 오랜만에 진출했던’ 포스트시즌에서 팀 전력의 반도 쏟아붓지 못한 채 한국시리즈 진출 티켓을 라이벌 두산에게 넘겨줘야 했다. 그만큼 11년이라는 공백은 이병규나 LG 모두에게 너무 긴 시간이었고, 이러한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했다.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이병규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의 ‘꾸준함’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부상으로 시즌 초반부터 결장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0.348의 고타율로 ‘최고령 타율왕’에 올랐다. 내년이면 마흔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자기관리’에 철저한 이가 바로 이병규다. 데뷔 이후 2003시즌 딱 한 차례만 제외하고 전 시즌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산 디마지오’라 불리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eugenephil@daum.net]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