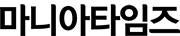그러나 이 당시 롯데 마운드에 박동희, 염종석, 윤학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92년을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난 김시진도 있었다. 비록 선수 마지막 해에는 4경기에만 나서며 10과1/3이닝을 소화했을 뿐이었지만, 롯데에서 유니폼을 벗었을 때 그는 이미 현역 통산 124승을 거두고 있었다. 또한, 고향팀 삼성에서 맛보지 못했던 ‘한국시리즈 우승’을 트레이드 이후에야 경험했다는 ‘묘한 인연’을 지니고 있다. 따지고 보면, 롯데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할 당시에는 모두 김시진이 있었던 셈이다. 1984년에는 상대팀(삼성) 에이스로, 1992년에는 퇴임을 앞둔 소속팀 선수로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이다.
롯데, 이대로라면 ‘제2의 암흑기’ 열린다
문제는 롯데 구단 프런트의 ‘대응’에 있었다. 구단 내/외부적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여러 일에 대해서 사실 유무를 떠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곧 현장에 있는 우두머리(감독)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결국, 롯데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현장을 지원하는, 프런트 본연의 업무를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김시진 감독의 자진 사임으로 인한 롯데 프런트의 대응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성적의 좋고 나쁨을 떠나 최소한 자신들이 ‘모셔 온’ 사령탑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어야 했다. 그러나 배재후 단장은 “경질이 아닌, 자진 사임이기 때문에 잔여기간 연봉 지급은 없다.”라는 말로 끝까지 김 감독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설령 그것이 이치에 맞는 이야기라 해도 “잔여 연봉 지급 유무에 대해서는 내부 결정 후 김 감독님과 상의하여 결정하겠다.”라는 말로 즉답을 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배 단장의 대응 부족으로 인하여 ‘구두쇠’ 이미지가 가득했던 구단 이미지에 더욱 먹칠을 한 셈이 됐다. 또한, 김 감독이나 구단 모두 ‘자진 사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든 장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롯데 감독자리’는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롯데는 ‘기억하기 싫은’ 2000년대 최악의 암흑기를 재현할 수밖에 없다. 이미 본지에서는 '방향'을 올바로 제시할 수 있는 수뇌부가 얼마나 '깨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구단 운영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롯데는 훌륭한 성장 동력과 기업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을 눈앞에 두고도 이를 전혀 활용할 줄 모르는 셈이다.
[eugenephil@daum.net]
▶ 부킹 정보를 한 눈에 ☞ 마니아리포트 부킹 게시판 바로가기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