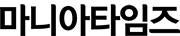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2018년 계명대총장배 전국태권도품새대회에서 참가 선수들이 평원 품새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제공]](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20107113716010995e8e9410872112161531.jpg&nmt=19)
평원이라는 말은 ‘평평한 평(平)’과 ‘언덕 원(原)’자의 합성어로 된 한자어이다. 한자어 사전에 따르면 평(平)자는 악기 소리의 울림이 고르게 퍼져나간다는 뜻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고르거나 평평하다는 뜻을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원(原)자는 ‘근원’이나 ‘근본’이라는 뜻을 가졌다. ‘기슭 엄(厂)’과 ‘샘 천(泉)’자가 결합한 모양으로 돌 틈에서 솟아 나오는 모습을 한자화한 것이다.
태권도 품새에서 평원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동작 모양이 ‘한 일(一)’형을 이룬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품새 평원은 1967년 태권도형을 통일시키기 위해 마련된 품새 9개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품새형으로 ▲고려형(高麗型)(일자형(一字型) ▲신라형(新羅型)▲백제형(百済型)▲십진형(十進型)▲태백형(太白型)▲김강형(金剛型)▲지태형(地跆型)▲천일권형(天一拳型)▲한수형(漢水型) 등이 확정됐다. (본 코너 590회 ‘태권도 품새에서 ‘고려(高麗)’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참조) 나중 품새형으로 결정된 평원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무술형 등의 이름을 사용한 기존의 명칭들과는 달리 좀 색다르게 정해졌다.
대한태권도협회 품새 경기규칙에 따르면 평원 품새는 팔굽 올려치기부터 학다리서기 금강막기까지 7단계로 나눠 기준점과 표현력 등으로 평가를 한다. 각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는 감점을 부여한다. 평원품새는 이름대로 연무선에 동작 기술들의 성질이나 기질을 잘 속아 넣어 시연해야 한다는게 태권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품새 특징이 들고 나는 기술들의 조합과 구조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평원 품새는 지킬 때와 나아갈 때를 알아야 고수가 될 수 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