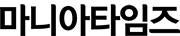그렇게 태어난 생물들은 또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경쟁은 태생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은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으로 불린다.
그러나 경쟁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무한경쟁에 따른 약육강식과 냉혹함과 잔혹함이 수반된다.
하지만 경쟁을 무서워하고 회피하기만 한다면, 삶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삶 자체가 경쟁이니만큼 경쟁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어느 쪽이 나은지 결론짓기가 쉽지 않다.
다만, 경쟁을 하면서도 1등과 꼴찌 모두 행복한 사회가 가장 바람직할 수 있다.
프로 스포츠에서는 경쟁이 최고의 미덕이다. 경쟁없는 프로 스포츠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최종 우승자만이 대접받는다. 반면, 꼴찌는 무시당한다. 한 푼도 챙기지 못한다.
기존의 PGA 투어가 그 중 하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끝까지 생존한 선수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 보장된다. 꼴찌에게는 거의 한 푼도 주지 않는 구조다. 철저한 시장경제 논리다.
그런 논리에 반발한 조직이 LIV 골프다.
'호주산 백상어' 그레그 노먼은 오랫동안 이런 PGA 투어에 대한불만을 품고 있었다.
노먼은 PGA 투어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했다.
노먼은 LIV로 골프의 '유토피아'를 꿈꿨다.
PGA 투어보다 적은 54홀로 대회를 치를 뿐 아니라 꼴찌에게도 미국인들 연봉보다 많은 상금을 주기로 했다. 재미교포 김시환이 최하위를 했는데도 12만 달러(약 1억6천만 워)를 챙겼다. 1위를 한 더스틴 존슨은 사흘 만에 400만 달러(약 45억 9천만 원)를 벌었다.
1위를 한 존슨이나 꼴치를 한 김시환 모두 해피 엔딩이었다.
경쟁을 하면서도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골프가 LIV인 셈이다.
LIV를 후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 오일 달러로 국가 이미지 제고가 되기 때문이다. 부자 사우디아라비아에게 LIV 전체 운영 비용은 '조족지혈'이다.
이런 LIV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선수가 얼마나 될까?
[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