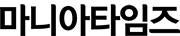키움의 리스크 감수 역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메이저리그에서도, 국내 야구계에서도 외면받았던 강정호를 복귀시키려 했던 시도는 그 정점이었다. 당시 구단은 선배로서의 기회와 전력 보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리그 전체의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행위였다. 팬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결국 무산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구단의 독단은 실력만 있으면 과거는 세탁 가능하다는 오만한 철학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에디슨 러셀의 영입 역시 마찬가지다. 메이저리그 시절 가정폭력 징계 전력이 뚜렷한 선수를 '실력파 외인'이라는 포장지로 감싸 안았다. 도덕적 결함이 있는 선수를 저렴하게 데려와 성과를 내겠다는 계산은 영리해 보일지 모르나, 그로 인해 구단 이미지에 박힌 '빌런 대피소'라는 낙인은 지우기 어려운 흉터가 되었다. 남들이 기피하는 매물을 주워 담는 것을 실리라고 부르기엔, 그들이 짊어진 도덕적 부채가 너무나도 무겁다.
최근의 박준현 사태 역시 앞선 사례들의 복사판이다. 교육청의 판결보다 선수의 소명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과거 강정호나 러셀 때 보여준 구단의 '선택적 믿음'과 궤를 같이한다. 문제적 인물들을 끊임없이 끌어안으면서도 궁색한 변명만 반복하는 사이, 키움의 브랜드는 '도전하는 영웅'이 아닌 '논란의 빌런'으로 변질됐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지만, 팬들은 기록 너머의 가치를 본다. 범죄 전력자와 학교폭력 가해자, 사법 방해 혐의자들로 라인업을 채워나가는 구단을 향해 어떤 어린이가 '영웅'을 꿈꾸며 야구장을 찾겠는가. 그들이 거두는 승리는 박수받지 못하는 그들만의 잔치로 남을 수밖에 없다.
[강해영 마니아타임즈 기자/hae2023@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