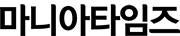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선수들이 고려 품새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1231063903063625e8e9410871751248331.jpg&nmt=19)
태권도에서 유품자 및 유단자 제1품새 이름인 고려 품새는 고려 왕조와 관련이 깊은 이름이다. 고려는 태권도 유급 과정인 태극품세를 마치고 초단이 되면서부터 수련하는 30개 동작으로 구성된 품새이다. 선비 사(士)자 모양으로 진행되며, 태권도인으로서의 자립과 독립을 절도있는 동작이 특징이다. 태권도는 고려라는 한국적인 품새이름으로 오늘날 전 세계인의 무예로 발돋음 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우리나라 왕조국가의 이름이 세계화된 용어로 자리를 잡은 격이다. 고려 품새는 한국어 발음대로 영어로 ‘koryo poomsea’로 표기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고려에 대해 ‘중세에 세워진 통일 왕조 태봉국(泰封國)의 장수 왕건(王建)이 918년 임금인 궁예(弓裔)를 몰아내고 송악(松嶽)에 도읍(都邑)하여 세운 나라’, ‘고구려(高句麗)의 이름’ 등으로 풀이한다. 고려는 한자어로 ‘높은 고(高)’와 ‘고울 려(麗)’자가 결합해 고귀하고 높은 국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태권도 품새에서 고려라는 말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보도는 1967년 12월20일자 조선일보 ‘태권도형 통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당시 기사는 ‘9개 신형을 제정’이라는 부제로 ‘태권도협회는 태권도형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18일부터 체육회관에서 고단자들을 대상으로 신형강습회를 실시했다. 동협회가 기안한 이 태권도신형은 오는 22일까지 강습회가 끝난후 명년 2월의 승단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된 9개형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고려형(高麗型)(일자형(一字型))▲신라형(新羅型)▲백제형(百済型)▲십진형(十進型)▲태백형(太白型)▲김강형(金剛型)▲지태형(地跆型)▲천일권형(天一拳型)▲한수형(漢水型)’이라고 보도했다. 고려형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영어 ‘Corea’의 어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적합한 단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권도에서 ‘고려형을 통과했다’는 말은 태권도 고수의 등용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 국기원에서 출간한 국기 태권도 교본은 고려 품새에 대해 ‘고려 품새는 선배를 의미하며, 선배는 강력한 상무정신과 곧은 선비정신을 나타낸다. 고구려-발해-고려로 이어지는 선배(선비)의 얼을 바탕으로 하여 품새로 엮어졌다’로 설명한다. 고려 품새는 모양이 한자 ‘선비 사(士)’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이다. 원래 선비 정신은 인격적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학문과 덕성을 키우며 세속적 이익보다는 대의와 의리를 위해 목숨까지 던지는 정신으로 통한다고 한다.
이경명의 태권도 용어사전에 따르면 고려 품새는 9개로 구성된 유단자 품새 가운데 첫 번째 품새이다. 유단자로서 고려 품새선에 따라 동작을 숙달하며 단지 공방동작의 기술적 숙련이 전부가 아니고 품새 이름과 품새선이 함의하고 있는 참다운 의미를 깨달아 인성과 인격 수양을 하도록 하는 상징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인성과 인격수양은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도장에서의 수련은 몸과 마음을 갈고 닦는 공부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태권도 수련은 마음으로 닦은 것을 몸으로 직접 살피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려 품새는 태극 품새와는 달리 유단자 품새답게 많은 기술이 등장한다. (본 코너 589회 ‘태권도 품새에서 왜 ‘태극(太極)’이라는 말을 쓸까‘ 참조) 거듭옆차기, 손날바깥치기, 한손날아래막기, 칼재비, 무릎꺽기, 안팔목몸통헤쳐막기, 주먹표적지르기, 편손끝젖혀찌르기, 바탕손눌러막기, 팔굽옆치기, 메주먹아래표적치기 등이다. 특히 메주먹 표적치기는 가상의 목표물을 만들어 놓기위해 한쪽 손으로 주먹을 지른 상태에서 다른 손의 메주먹으로 다른 한쪽 손을 목표물을 해서 치는 기술이다. 품새등 수련 동작을 할 때에 많이 사용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