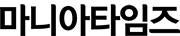체조는 영어 ‘Gymnastics’와 독일어 ‘Gymnastik’를 번역한 말이다. 모두 그리스어로 나체를 뜻하는 ‘Gymnos’가 어원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달리기, 뛰기, 던지기, 복싱, 레슬링 등 여러 경기가 나체로 진행한데서 유래된 말이다. 그리스어로 벌거숭이를 뜻하는'γυμνός(gymnós)'에서 유래했다. ‘γυμνάζω(gymnazo)’는 벌거벗고 운동하다는 의미가 됐으며 라틴어, 중세 그리스어를 거치면서 ‘Gymnasticos’나 ‘Gymnazein’으로 변형됐다. 'Gymnazein'은 체육관을 의미하는 ‘Gymnasium’으로 발전했다. (본 코너 851회 ‘왜 ‘체조(體操)’라고 말할까‘ 참조)
북한은 해방 이후 ‘조선말의 주체화’를 내세우며 외래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정리했다. ‘체조(體操)’는 일본식 교육 체계에서 비롯된 용어로, “비인민적이고 추상적인 말”로 규정했다. 대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생활어, ‘몸단련운동’을 ‘체조’ 대신 사용했다. 북한에서 체육은 개인의 취미나 미적 표현이 아니라, ‘혁명적 인간’을 키우는 도구로 간주된다. 체조가 예술적 기교와 개인의 기량을 상징한다면, 몸단련운동은 집단의 규율과 체제의 힘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 북한식 체육은 미(美)가 아니라 투지(鬪志)를 위한 것이다. (본 코너 1551회 ‘북한에선 왜 ‘스포츠’ 대신 ‘체육’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 참조)
북한은 세계적인 체조 강국이다. 특히 올림픽에서 성적이 두드러졌다. 배길수는 1992년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루(기계체조)에서 북한 체조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홍은종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리세광은 2016년 리우 올림픽 남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각각 획득한 바 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