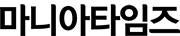영어용어사전에 따르면 영어 ‘feint’는 라틴어로 ‘만지다’는 의미인 ‘fingere’에 어원을 두고 있다. 고대 프랑스어로 ‘거짓되다’는 뜻인 ‘feint’라는 말이 영어로 건너왔다. 페인트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동작을 하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600년대부터였으며 스포츠에서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영국에서 근대스포츠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인 1800년대부터 였다고 한다. 중세 프랑스의 검술·펜싱 용어에서 많이 쓰였다. (본 코너 518회 ‘왜 ‘페인트(Feint) 공격’이라고 말할까‘ 참조)
우리나라 언론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페인트’라는 말을 썼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따르면 조선일보 1929년 12월7일자 ‘중등농구(中等籠球) 연맹전총평(聯盟戰總評) ④’ 기사에 ‘아직도 중등농구(中等籠球)의 현상(現象)은 결점(缺點)과 부족(不足)함이만타.첫째로 개인적(個人的)으로본다면 투사(投射)에 정확성(正確性)이 늘엇슴은 확실(確實)히 인정(認定)할수잇스며 몃몃은 전문대학급(專門大學級)에비(比)하여도 조금도 손색(遜色)이 업슬만한 선수(選手)도불소(不少)하다 그러나 페인트·뜌립·피봇·쾨스돕급(及) 스타—트등(等) 기초기술(基礎技術)은 매우 부족(不足)하다 공격자(攻擊者)는 좀더이상기초연습(以上基礎練習)을하여 항상적(恒常敵)의 방어선상(防禦線上)에서 이탈(離脫)하도를 하여야할것이다 다만 뽈만잡으면 거리(距離)의원근경우(遠近境遇)의 여하(如何)를 불관(不關)하고투사(投射)를 시(試)함은 아무리 투사(投射)에 정확성(正確性)이잇다하더라도 묘책(妙策)이라핥수는업슬것이다 (계속(繼續))’라고 보도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 말기 조선 중등학교 농구의 기술 수준을 평가한 기사로 당시 농구협회 지부에서 활동한 이성구씨가 썼다.
축구 기술 ‘페인트’ 역시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외래어는 받아들이지 말고, 가능한 한 자국어의 뜻으로 기능을 설명하는 형태였다. 이때 선택된 단어가 바로 ‘제끼다’였다. 한국어 고유어 ‘제끼다’는 원래 상대를 비켜 넘기다, 따돌리다, 혹은 추월해 지나간다는 뜻을 갖는다. 수비수의 중심을 무너뜨려 그 옆을 스쳐 지나가는 페인트의 본질과 정확히 맞아떨어진 셈이다. 흔히 일상에서 “앞차를 제끼고 갔다”라고 말하는 것과 구조가 같다. 북한이 외래어 대신 고유어의 의미적 대응을 선호하는 경향이 이 표현에도 반영됐다.
주목할 점은 북한 기사에서 ‘제끼기’가 단순한 드리블 기술을 넘어 상대를 따돌리는 전술적 문맥까지 포괄한다는 점이다. 북한 축구 해설·신문 기사에서는 “공을 몰아나가며 수비수를 하나 제끼고…”, “번개같은 제끼기로 상대 방어수를 속이며 문전으로 침투하였다”, “왼쪽에서 제끼기를 잘 써 상대를 혼란시켰다” 등으로 표현한다. 이런 문장에서는 ‘페인트 동작’이 아니라 상대 수비수 전체를 따돌리는 동작까지 포함한 의미로 확장돼 쓰였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