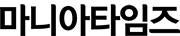그러나 그녀의 기록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에 의해 공인되지 않았다. 북한이 GANEFO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비공인 선수’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신금단 개인의 실력이 아닌 체제의 정치적 노선이 그녀의 국제무대 진출을 가로막은 셈이다.
1964년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신금단은 눈물로 아버지를 만났다. 1950년 6·25 전쟁이후 부녀가 헤어진 뒤 14년 만의 상봉이었다. 그러나 그 만남은 7분에 불과했다.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북한 대표단은 그대로 평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꿈꾸던 올림픽 트랙은 끝내 밟지 못했다. 신금단의 이름은 분단의 상처 위에 새겨졌다.
북한은 고전적 의미를 사회주의식으로 재해석했다. 1956년 김일성이 ‘천리마 운동’을 제창하면서, 천리마는 자력갱생과 초인적 생산정신의 상징으로 변모했다. 당시 ‘천리마를 탄 노동자’는 하루 일을 열흘 치로 해내는 혁명적 근로자상으로 미화됐다. 이후 천리마 제철소, 천리마 체육단, 천리마상(賞) 등 각종 명칭에 이 단어가 붙으면서, 북한 사회주의 근대화의 대표 상징이 됐다. 고대 중국에선 ‘잠재된 인재’를 뜻했지만,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근로영웅’을 뜻하는 정치적 상징어로 바뀐 셈이다. 오늘날 ‘천리마’는 북한식 동원 체제의 뿌리를 보여주는 단어로, 근면·충성·헌신의 이데올로기를 함축한 시대적 표상이 됐다.
북한은 당시 체육에서 영웅으로 떠오른 신금단에게 이 천리마라는 칭호를 붙여 ‘천리마 시대의 여걸’로 미화했다. 가난한 배경에서 사회주의 체제 하의 노동자·학생 생활과 체육 활동을 병행하면서 ‘노동자 속의 영웅’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는 해석이다. 천리마처럼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투혼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이다.
북한은 이후 신금단을 ‘인민체육인’으로 기리고, 사회주의 여성의 표상으로 내세웠다. 그녀의 이야기는 ‘김일성의 딸처럼 당을 위해 달린 여인’으로 각색됐다. 하지만 실제 신금단의 삶은 국가의 서사 속에서 사라졌다. 훈장을 받고 영웅이 되었지만, 개인의 서러움과 꿈은 기록되지 않았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