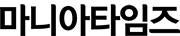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catcher’은 ‘잡다, 붙잡다’는 뜻을 가진 동사 ‘catch’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er’이 결합된 단어이다. ‘catch’는 게르만어계 공통어근에서 유래했으며, 고대 영어 ‘ceac’, ‘ceacian’과 중세 영어 ‘cacchen’ 형태를 거쳐 근대 영어로 변형됐다. 스포츠용어로서 ‘catcher’는 19세기 미국 야구에서 정착하면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잡는 선수’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다.
우리나라 언론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투수라는 말을 사용했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따르면 조선일보 1923년 5월5일자 ‘대분투(大奮鬪)의예선전(豫選戰) 납함돌격(吶喊突擊)의기세(氣勢)가충천(衝天)’ 기사는 ‘제이회신명영협보 제사번타자 김기동(第二囘新明零協普第四番打者金基東)은 안타(安打)로 출(出)한후적(後敵)의 실책(失策)으로 우일점(又一點)을 선취(先取)하다연(連)하야 신명군(新明軍)의 투수(投手)의구(球)를 연속안타(連續安打)한결과(結果)에 만루(滿壘)의호기(好機)와 뻐ㄴ토로 십오점(十五點)을취(取)하다 제삼회신명(第三囘新明)의 제칠번타자삼진후협보군(第七番打者三振後協普軍)의 포수(捕手)의 실책(失策)으로 일점(一點)을 취(取)하얏스나 신명(新明)의 강군(强軍)도 협보군(協普軍)에는 엇지할수업시 기권(棄權)하야 구대령(九對零)으로 협보군(協普軍)이 승첩(勝捷)하고 소학교(小學校)테ㅁ의 결승(決勝)은 협보군(協普軍)과 공옥군(攻玉軍)이 오일(五日)에 최후결승전(最後決勝戰)을하게되얏다’고 전했다. 당시 기사에서 투수와 함께 포수라는 말을 썼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1950년대 이후 언어를 ‘쉽게, 우리식으로’ 고치려는 정책을 꾸준히 밀어붙였다. 스포츠도 예외가 아니었다. 태클을 ‘가로막기’, 인터셉트를 ‘끊기’, 슬라이딩을 ‘미끄러져 들어가기’로 바꾸는 식이다. 전문적인 용어보다 기능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말들이 선호됐다. 이는 스포츠를 처음 접하는 대중에게 용어를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본 코너 1613회 ‘북한 축구에선 왜 ‘인터셉트’를 ‘끊기’라고 말할까‘ 참조)
포수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됐다. 포수는 한자로 ‘잡을 포(捕)’자를 쓰지만, 실제 경기에서 그가 하는 일은 더 명확하다. “던지는 사람”인 투수가 공을 보내면, 뒤에서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 북한식 표현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옮겼다. 포수를 ‘받는 사람’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방 직후 북한 신문을 보면 야구 포지션을 “던지는 사람”, “받는 사람”, “첫길을 지키는 사람”처럼 풀어 쓰는 관행이 자주 등장한다. 대중적 기초가 약한 상황에서 스포츠를 이해시키기 위해 해설처럼 풀어 설명하던 언어가 그대로 굳어졌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