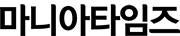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남북한 축구대표 경기. 북한은 사회주의 관점에서 만든 스포츠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1109082544051595e8e9410871751248331.jpg&nmt=19)
사회주의라는 말은 원래 일본식 한자어이다. 한자어 ‘사회(社會)’는 중국 고전에서 “모여 사는 인간 집단”을 뜻했다. 일본 메이지 시대에 ‘socialism’을 번역하면서 ‘사회주의(社會主義)’라는 용어가 만들어졌고, 이후 한국과 중국에도 그대로 사용했다. 한국에선 일본의 영향을 받아 일제강점기때부터 이 말을 썼다.
영어 ‘socialism’ 어원은 동료,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라틴어 ‘socius’에서 비롯됐다. 여기서 파생된 ‘socialis’가 프랑스어 ‘social’, 영어 ‘socialism’으로 발전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공동체적 삶의 원리’ 혹은 ‘함께 사는 방식’이라는 뜻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 용어를 체계화했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단계”로 규정했다. 즉,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계급 없는 사회로 가는 과도기로 정의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며, 최종적으로는 ‘공산주의’로 발전한다.
해방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했다. 북한 스포츠용어에는 노동, 집단, 자주, 인민이라는 사회주의의 네 가지 핵심 가치가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스포츠를 ‘놀이’가 아닌 ‘노동적 단련’으로 본 시각이 뚜렷하다. 체조를 ‘몸단련운동’, 수영을 ‘헤염치기’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 코너 1594회 ‘북한에선 왜 ‘수영’을 ‘헤염치기’라고 말할까‘, 1596회 ’북한에선 왜 ‘체조’를 ‘몸단련운동’이라 말할까‘ 참조)
북한에서 체육은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취미가 아니라, 혁명가의 체질을 단련하고 생산적 노동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행위다. 김일성은 “몸단련운동은 혁명가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의 체육 언어는 노동의 땀을 미화하고, 개인의 쾌락보다 인민의 건강을 우선한다.
북한 스포츠 언어는 집단주의의 산물이다. 자본주의 스포츠가 개인의 스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북한은 집단의 단결을 강조한다. ‘팀’을 ‘집단’이라 부르고, ‘주장’을 ‘기둥선수’라 하는 까닭이다. ‘스타플레이어’ 대신 ‘높은급 선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스포츠에서 승리는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인민 전체의 단합과 국가의 체제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본 코너 1585회 ‘북한에선 왜 ‘스타플레이어’를 ‘높은급 선수’라고 말할까‘, 1586회 ’북한에선 ‘주장(主將)’을 왜 ‘기둥선수’라고 말할까‘, 1598회 ’북한에선 왜 ‘팀’을 ‘집단’이라 말할까‘ 참조)
또한 북한은 스포츠 심판을 ‘재판원’이라 부른다. 경기의 공정성을 ‘재판’의 정의로 바꿔 표현한 것이다. 응원단 역시 ‘팬’이 아니라 ‘응원자’ 혹은 ‘관람자’라 한다. 영어식 표현이 상업적이고 개인주의적 이미지를 띠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어의 정비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사상의 통제이자 문화의 정치학이다. (본 코너 1584회 ‘북한에선 왜 ‘심판’을 ‘재판원’이라 말할까‘, 1588회 ’북한에선 왜 ‘팬(fan)’을 ‘응원자,관람자’라고 말할까‘ 참조)
1960년대 이후 북한은 ‘문화어’ 제도를 통해 모든 언어를 노동자와 농민이 쉽게 쓰도록 다듬었다. 스포츠 용어의 정비도 그 일환이었다. “언어를 바로 세우는 것은 사상도덕의 문제이며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는 길”이라는 김일성의 말은, 체육 언어가 단순한 운동용어가 아니라 체제유지의 도구였음을 잘 보여준다. (본 코너 1581회 ‘북한은 문화어에서 스포츠 용어를 어떻게 바꾸었나’ 참조)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