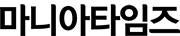영어 ‘Team’은 끌리는 동물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 게르만어 ‘Taumaz’가 어원이다. 이 말이 고대 영어 ‘Tamam’으로 차용돼 두 마리 이상의 초식 동물을 의미했다.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는 집단’이라는 팀의 본래 의미는 동물들이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개념에서 발전했다. 스포츠에서 팀이라는 말은 1800년대 영국 크리켓에서 먼저 사용했다. 이후 야구 등 여러 구기 종목에서 쓰게됐다. (본 코너 1465회 ‘왜 ‘팀(Team)’이라 말할까‘ 참조)
우리나라 언론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팀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 의하면 조선일보 1925년 3월28일자 ‘30對(대)22로 同胞(동포)팀勝(승)’ 기사는 ‘일본동경(日本東京)에 잇는 기독교(基督敎) 청년회(靑年會)『빠스켓뽈』틤이 지난이월십팔일춘양환(二月十八日春洋丸)으로 포와(布哇)에 향(向)하야 원정(遠征)하얏다함은 기보(旣報)한바어니와 지난삼월십이일(三月十二日)에 포휴(布畦)에잇는 조선인(朝鮮人)틤과대항경기(對抗竸技)를 하게되얏는데 삼십대이십이(三十對二十二)로 조선동포(朝鮮同胞)가 일본인원정군(日本人遠征軍)을 격파(擊破)하얏다 조선동포군(朝鮮同胞軍)으로는김천용군(金千龍君)의 날쌘재조(才操)가 그승인(勝因)의 다수(多數)를차지하얏다한다 김군(金君)은 포와(布哇)『누와누』조선인기독교청년회(朝鮮人基督敎靑年會)틤의『례프트□포트』의위(位)에잇서서칠개(七個)의『꼴』을너헛다 조선인군(朝鮮人軍)의『피싱』은 더욱민활(敏活)하고교묘(巧妙)하야 일본인(日本人)의 견진(堅陣)을돌파(突破)하얏스며그중(中)에도 김천용군(金千龍君)은 오분(五分)동안의『필드꼴』을 다섯 번집어너허 동포(同胞)의환희(歡喜)에넘치는박수(拍手)소래는 양(洋)을격(隔)한 이역풍토(離域風土)의 오직하나인븜것을 늣기게하얏섯다 전반전(前半戰)에는 십삼대십(十三對十)으로 우리동포(同胞)가익이엇스며 후반전(後半戰)에적(敵)은회복(恢復)코저 극력노력(極力努力)하얏스나 원톄동포군(同胞軍)은적진(敵陣)을육박(肉迫)하이적(敵)의석교군(石橋君)이겨우십이점(十二點)을어덧슬뿐이오반(反)히이동포군(同胞軍)은십칠점(十七點)을어더결국삼십대이십이(結局三十對二十二)로□승(勝)을하얏다’고 전했다. 우리 동포 농구팀이 포와(하와이 음역)에서 일본인 원정군을 격파했다는 기사였다.
북한은 ‘집단’을 단순한 조직 개념이 아니라, 사회주의 이념의 핵심 언어로 발전시켰다.
‘집단주의’(集團主義)는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상적 원리로 정의되며, 김일성의 ‘우리식 사회주의’ 담론과 결합해 정치적·도덕적 가치어로 자리 잡았다.
북한의 체육보도는 언제나 ‘집단의 위훈(偉勳)’을 부각한다.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선수라도 개인의 이름보다는 ‘우리 집단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는 개인의 영웅화를 경계하고, 모든 성과를 국가와 체제의 공로로 돌리는 정치 언어의 산물이다. 개인보다 ‘우리’가 앞서고, ‘우리’는 곧 ‘당과 수령’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어 구조 속에서 ‘팀’이라는 외래어는 체제적 이질어로 여긴다. 북한이 ‘팀’을 버리고 ‘집단’을 고집하는 이유는, 개인보다 국가를, 자율보다 통제를 중시하는 사회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