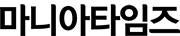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북한 관광책자에 소개된 평양 골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1021104256090905e8e9410871751248331.jpg&nmt=19)
당초 문화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 때, ‘문화로서의 언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북한의 '문화어’의 어원은 단순한 언어적 조어가 아니라, 혁명적 언어를 통한 새 사회 건설이라는 이념적 의지의 산물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의 언어’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해 사상·정치·문화의 통일성을 언어로 구현한 것이 바로 북한식 ‘문화어’의 본질이다.
월북한 정동주, 박병천 등 국어 학자들이 초창기 평양말 기반 표준어를 확립하고 신조어 개발 참여했다. 이들은 ‘문화어 용어사전’을 편찬하고 문법·맞춤법 정비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북한의 ‘문화어’ 개념은 언어도 계급성을 가진다는 사회주의 언어관에 기반한다. 김일성은 “언어는 인민의 사상과 문화의 그릇이며, 반동적 잔재를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화어는 ‘노동계급 중심의 언어’, 지배계급(식민 잔재·지식인 중심 언어)을 제거한 ‘혁명적 언어’로 정의된다
북한은 스포츠 용어도 “근로인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혁명적 언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나 자본주의적 냄새가 나는 외래어는 배격하고, 우리말 어근 중심의 순화·재구성이 기본 방침이었다.
북한은 문화어 정책을 통해 세 가지 방향으로 언어를 정비했다. 먼저 순우리말화이다.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외래어 대신 고유어 사용을 강화했다. 예를들어 ‘라디오’를 ‘방송수신기’, ‘텔레비전’을 ‘텔레비죤’, ‘트레이너’를 ‘지도원’ 등으로 바꿨다. 다음은 정치 사상의 용어화이다. 지도자와 체제를 찬양하는 언어를 일상화했다. 예를들면 ‘국가대표팀’을 ‘공화국대표팀’, ‘국민체육’을 ‘인민체육’ 등으로 불렀다. (본 코너 1565회 '북한은 왜 ‘국민체육’ 대신 ‘인민체육’이라는 말을 사용할까' 참조) 또 계급적 의미를 강화하는 말들로 바꿔 사용했다. 이는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표현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장’보다 ‘체육장’, ‘선수단장’ 보다 ‘지도원’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