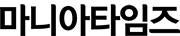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1991년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 코리아 단일팀 북한 지도원 문기남 코치(오른쪽). 그는 2003년 탈북, 한국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다 올해 타계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1023074324001135e8e9410871751248331.jpg&nmt=19)
스포츠 종목에서 감독은 선수들을 훈련하고 실제 경기에서 지휘자로 모든 책임을 진다. 국어 사전에 ‘감독(監督)’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보살피고 지도·단속하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자어 ‘볼 감(監)’과 ‘살펴볼 독(督)’을 의미대로 해석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면 감독이라는 한자어가 600건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오래전부터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어로도 감독은 똑같은 한자어로 쓰고 발음도 ‘칸토쿠’라고 비슷하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한자 문화권인 한·중·일 등에서 옛날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코너 136회 ‘야구에서 ‘감독’을 왜 ‘매니저(Manager)’라 말할까‘ 참조)
북한이 ‘감독’ 대신 ‘지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단순한 언어 순화 이상의 사상적·체제적 이유가 있다. 이 용어는 사회주의 체육철학, 즉 ‘체육은 군사력과 사상력을 키우는 정치사업의 일부’라는 인식 속에서 만들어졌다.
북한에서 “지도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정치사상적으로 집단을 인도하는 사람, 즉 ‘정신적 교양자’의 의미가 강하다. 북한 공식 기관지 노동신문은 ‘체육지도원은 경기성과보다 선수들의 혁명적 기백과 조직성, 단결정신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체육지도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 체육은 당, 체육지도위원회,체육단 지도원 ,선수로 이어지는 구조로 돼 있다. 이 체계에서 ‘지도’는 단순히 기술 지도를 뜻하지 않고, ‘사상적 통제와 조직적 지휘’를 의미한다. (본 코너 1551회 ‘북한에선 왜 ‘스포츠’ 대신 ‘체육’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 참조)
따라서 ‘감독’이라는 단어보다 ‘지도원’이 체제 용어로 더 적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축구팀에서 ‘지도원’은 전술 훈련뿐 아니라 ‘정세 학습’, ‘혁명전통 교양’, ‘당 정책 학습’ 등을 함께 담당한다.
1991년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 코리아 단일팀 북측 코치를 맡아 8강 진출에 기여했던 문기남 지도원은 북한 여자대표팀과 남자대표팀을 이끌다가 2003년 탈북, 한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울산대 축구팀 감독을 맡아 전국체전 준우승과 지도자상을 수상하는 등 성공적인 활동을 하다가 지난 8월 항년 77세로 타계했다. 북한과 남한을 모두 경험한 지도자로 축구를 통한 남북 교류 가능성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