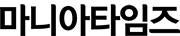‘throw-in’은 말 그대로 'throw(던지다)'와 'in(안으로)'이 합쳐진 단어이다. ‘throw’라는 동사는 고대 영어 ‘prawan’에서 비롯되며, ‘던지다·내던지다·세게 밀다’라는 의미를 지닌 게르만어족 고유 어휘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in’ 역시 고대 영어 형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단어이므로 ‘throw-in’은 문자 그대로 ‘안쪽을 향해 던지는 행위’를 뜻한다.
이 단어가 축구 규칙 용어로 굳어지는 데에는 19세기 잉글랜드 축구의 규칙 통일 과정이 결정적이었다. 1863년, 런던의 여러 구단이 모여 축구와 럭비를 분리하는 역사적 회의를 열었을 때, 공이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의제였다. 당시 각 지역 규칙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곳은 킥으로 재투입했고, 어떤 곳은 럭비식 스크럼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공을 다투었으며, 어느 곳에서는 단순히 ‘가장 먼저 공을 잡은 사람이 다시 넣는다’고 규정했다. 이 혼재된 방식 속에서 FA는 최초의 통일 규칙을 만들며 “첫 번째로 공을 잡은 선수가 그것을 안으로 던져 넣는다(throw it in)”고 명문화했다. 여기서 동사구 ‘throw it in’이 이후 고정된 명사적 표현인 ‘throw-in’으로 굳어졌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체육 용어에서도 ‘주체적 민족어’를 확립한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면서 영어식 표현 ‘드로인’이 직역이나 음차가 모두 외래어 느낌이 강하다는 판단하에 경기장으로 옆에서 던져 넣는 것”이라는 기능적 특징을 명시해 ‘옆던지기’라는 순우리말화 용어를 택했다. (본 코너 1581회 ‘북한은 문화어에서 스포츠 용어를 어떻게 바꾸었나’ 참조)
북한 체육용어는 ‘직관성’을 중시해 말 그대로 보이는 동작을 설명식으로 풀어낸 것이 많다.
예를들면 ‘코너킥’을 ‘구석차기’, ‘프리킥’을 ‘벌차기’, 패스를 ‘넘기기’, ‘골키퍼’를 ‘문지기’ 등으로 푷녀하는 경우이다. 이 구조에 따라 스로인도 경기장 옆선에서, 팔을 머리 뒤에서 앞으로 가져와 공을 던져 넣는 동작을 그대로 ‘옆에서 던진다’는 뜻의 ‘옆던지기’로 표현한 것이다. (본 코너 1604회 ‘북한에선 왜 ‘골키퍼’를 ‘문지기’라고 말할까‘, 1606회 ’북한 축구에서 왜 ‘코너킥’을 ‘구석차기’ 또는 ‘모서리뽈’이라 말할까‘, 1607회 ’북한에선 왜 ‘프리킥’을 ‘벌차기’라고 말할까‘ 참조)
북한은 던지는 기술을 체육 전반에서 ‘던지기’ 계열로 체계화해 사용한다. ‘창던지기’, ‘원반던기지’, ‘포환던기지’ 등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축구에서도 동일 논리로 범주화해 기술 계열 통일성을 확보한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